우리 현대인들도 영화, 동화책 및 만화 등으로 잘 알지만 실제 원문 내용을 잘 모르는 두가지 문학 작품 춘향전과 구운몽의 시작은 이러 합니다.
춘향전 시작 서문 "숙종대왕 즉위 초에 성덕이 넙우시사 성자성손은 계계승승하사 금고옥적은 요순시절이요 ~~" 라고 시작한다.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구운몽 시작은 "천하에 명산이 다섯이 있으니 동쪽은 동악 태산이요, 서쪽은 서악 화산이요." 라고 하는 것을 영문으로 120년 전에 영문 번역하신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온라인 책 출간
2021년 토론토 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온라인 책이 출간 되었다. 그 책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있는 동안 게일은 한국 역사, 언어, 문학 분야에서 최고의 서양학자로 성장하여 최초의 한국문학의 서양어 번역, 최초의 영문문학의 한국어 번역, 최초의 한영종합문학을 완성했다.
제목: Redemption and Regret: Modernizing Korea in the Writings of James Scarth Gal(구원과 후회: 제임스 스카스 게일의 글을 통해 한국을 현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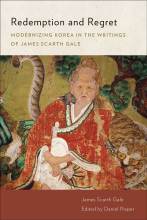
저자: James Scarth Gale
출판사: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2021
구원과 후회(Redemption and Regret)는 40년 동안(1888-1927)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James Scarth Gale)의 이전에 출판되지 않은 두 권의 타자 원고를 출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에 더해, 각각 소개 에세이와 함께 여기에 제시된 고대 한국의 펜 그림 (약 1910년)과 고대 한국 (약 1925년)이라는 제목의 타이프 스크립트에는 다양한 문화 유물, 행동 및 관행에 대한 게일의 관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일은 한국이 '은둔' 종주국에서 독립 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일본의 식민 지배로 전환되는 격동적이고 변혁적인 시기에 한국에 살았습니다. 고대 한국과 고대 한국의 펜 그림은 게일이 멸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글에 전통적인 한국의 "지나가는 것"에 대한 양면적 감정이 일어나게 된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근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한국이 현대 기독교 문화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서구 선교적 정체성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라고 편집자 다니엘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궁금 하지만, 상기의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아래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될것 입니다. 120년전에 우리나라의 문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게일이란 분에 대해 알고자 캐나다 온타리오주 알마로 떠나 보겠습니다.
알마(Alma)를 가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차로 남서쪽 약 1시간 30 분가면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 알마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한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 중의 하나인 세인트 앤드류 장로교회(아래 오른쪽 사진)가 아직도 있다. 바로 그 교회에서 140년 전 25세 한 청년이 조선을 향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바로 그가 제임스 게일 (James Scarth Gale) 선교사(아래 왼쪽 사진)이다.
 |
 |
선교 결심
선교사는 1888년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 후, 토론토대학교 YMCA의 지원으로 조선 선교사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에서 캐나다로 이민해 이민자 출신으로 세인트 앤드류 장로교회의 장로였다. 그가 선교사로 결심하게 된 사건은 1886년 매사추세츠주 마운트 허먼에서 미국과 캐나다 87개 대학, 251명의 학생들이 모여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를 인도했던 강사가 시카고 YMCA 지도자였던 무디(D. L. Moody)였다.
당시 그들이 외친 구호는 “모두 다 가자, 모두에게로”(All Should Go and go to all)였다. 게일은 1886년 무디 부흥집회에 참석하여 선교에 영향을 크게 받아 선교사가 되었다.

선교사 파송
그는 1884년 토론토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입학하여 1888년 6월에 문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대학 시절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던 게일은 1887년 학생선교운동의 선구자인 프린스턴신학교의 윌더와 포만이 토론토를 방문한 이후 한국 선교사역을 구체적으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 후 바로 대학 기독청년회(YMCA)에 자원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다.

조선 도착
1888년 10월 18일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하여 12월 15일 부산에 도착했다가 다시 북상, 제물포에 상륙하게 된다. 그 후 서울에 도착하여 12월 23일 주일 오후 2시 언더우드 집에서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 25세였다. 이듬해 3월에 황해도 해주를 거쳐 소래교회에 가서 몇 달을 지내면서 또는 전국을 여러 번 순회하면서 한국을 익히게 된다. 그러나 그의 파송단체가 재정난으로 게일의 선교비를 계속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친구 의사 헤론과 마펫의 주선으로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 적을 옮겼다. 그 후 1897년 5월 13일, 인디아나 주 뉴 알바니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북장로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는 처음 부산에 도착한 이후 몇 번의 안식년과 해외 일정을 제외하고 자기 인생의 절반이 넘는 40년의 세월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한국개신교 형성기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다.
서울 연동교회
연동교회는 조선 말기인 1894년에 설립된 오래된 교회이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모삼열(본명 S. F. Moore)이 1894년 전도하여 몇 명의 신자를 얻었고, 그래함 리(한국명; 이길함) 선교사와 서상륜이 연지동 136-17번지의 초가를 예배당으로 삼아 예배를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연동교회의 초기 신자들은 천민에 속한 갖바치들 즉, 신을 주업으로 삼는 노동자들이었다고 한다. 점차 신도가 증가하면서 이듬해에는 교육 기관인 연동소학교를 세워 여학생도 모집해 운영했다. 이 학교는 정신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바로 이 교회에 1900년에는 제임스 게일이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왔고, 이후 본격적으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때 게일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운 자가 바로 천민(갖바치 출신) 고찬익이 있었다. 그는 방탕생활을 하던 중 원산에서 게일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후 연동 교회의 초대 장로로 선출되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 7인 중 한 분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 한국선교의 불길을 지핀 게일선교사는 한국 복음화는 물론이고 교육, 성경번역, 찬송가 개편에 초석을 다지는데 중요 역할을 했던 열정과 헌신은 우리 민족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다.
성경번역 및 전래 동화 번역
그의 주된 사역이 전도와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해 해박했던 그는 1892년 성서 번역에 참여, 마태복음, 에베소서등 신약성서 중 일부를 번역했다. 1897년,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을 간행하였으며 <신/구약 성서>와 <천로 역정>을 한국어로 발간하였다.
한국인의 교육을 위해 ‘교육 협회’를 창립하였다. 또 <춘향전> <구운몽> 등을 번역하여 한국의 언어·풍습 등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며, 영국의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한글로 번역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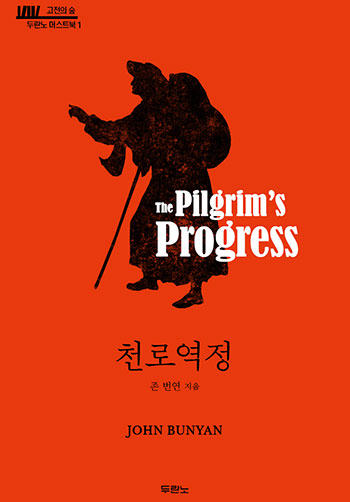 |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는 다재다능한 선교사로서 찬송가 개편, 기독교 교육, 기독 청년운동, 문서선교, 신학교육, 목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00년에 연동교회 1대 담임목사로 27년을 시무하면서 지식인들과의 활발한 접촉을 갖고 많은 지성인들을 교회로 오게 했다. 또 당시 양반들이 모인 교회에 천민들 역시 발을 들여놓게 한 장본인으로, 출신과 신분의 장벽이 없는 교회의 전통을 마련했다. 왕립 아시아 학회 한국부회 간사를 역임하였으며, 1928년 은퇴한 후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시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단지 그분이 선교사의 역할만 하고 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우수성을 이해하신 분이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풍성한 문화 국가로의 초석을 다지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캐나다 온타리오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캐나다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ROM) 관광 정보 (2) | 2024.06.11 |
|---|---|
| 캐나다 오로라 관측 여행 정보 (0) | 2024.05.14 |
| 캐나다 메이플 시럽 및 생산 농가에 대한 여행 정보 (2) | 2024.05.12 |
| 나이아가라 저니 비하인드 더 폴스 여행 정보 (2) | 2024.04.28 |
| 세계적인 인공 구조물인 토론토 CN 타워 이모저모 (0) | 2024.04.25 |